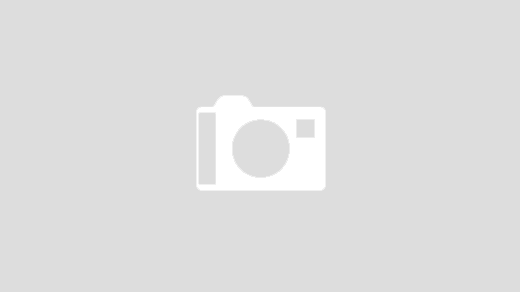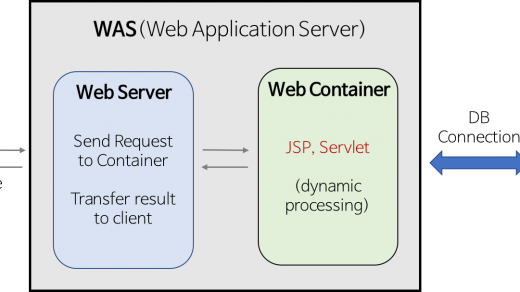✏️ 이커머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PG에 대한 정리를 해두려 한당 🙂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면 오프라인 결제가 VAN사를 거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온라인 결제에 대하여는 PG를 거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VAN(밴) 이란 무엇일까 ?
VAN (Value Added Network)
VAN이란 ? VAN이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써
‘부가가치통신망. 공중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각종 정보를 부호, 영상, 음성 등으로 교환하거나 정보를 축적하거나 또는 복수로 해서 전송하는 등 단순한 통신이 아닌 부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간단하게 말해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손님들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승인처리를 위해서는 통신회선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많은 신용카드회사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장님과 신용카드회사 사이에서 계약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중계업무 등등을 중계해주는 것을 VAN이라고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VAN회사, VAN사라고 한다.
그럼 PG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PG(Payment Gateway)
PG란 ? PG(Payment Gateway)사는 인터넷 상에서 금융 기관과 하는 거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신용 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이용 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주는 회사.
한국에 PG가 등장하게된 계기? 🤔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렇게 핫하지 않은 시절에는 카드사에서 일반 가맹점(일반 온라인 셀러)들과 계약을 해주지않거나 개인이 계약하는게 정말 힘들었다고한다. 그래서 이니시스, kcp와 같은 PG 업체들이 대표 가맹점이 되어 bc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과 계약하고 각 PG사들이 대표로 셀러들과 계약하는 방식의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금더 거슬러올라가서, 1995년에 ebay, amazon이 처음 설립됬을때만하더라도 결제수단이 현재처럼 다양하진 않았다고 한다.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전화 승인정도)
여기서 신용카드 전화 승인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물었다고 한다 😂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CVC).
이렇게 전화로 처리가 되다보니 당연히 보안이 문제가 되었다. 이때 미국에서는 SSL 128 bit 를 도입하여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지만, 한국은 당시 전쟁국가여서 라이선스는 수출 불가 국가중 하나 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안된게 민간분야 표준 암호인 ‘SEED’ 이다.
+ 추가) 997년 7월 이전에는 미국의 암호화제품 수출금지법에 의해 미국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7월 이후에서야 45개국의 금융기관에 수출을 허락했고, 2000년도가 되어서야 테러지원 국가(북한,이라크 ..)를 제외한 전 세계에 수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그레이는 1998년도에 서울은행과 함께 VISA카드를 사용할수있는 쇼핑몰 프로젝트 pm을 맡으셨다고한다.
이 당시에는 사실 SSL 128 bit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VISA / MASTER 사에서 만든 프로토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를 이용했다고 한다.
PG와 E-wallet의 차이 ?
PG는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일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 즉, PG 계약은 중개 거래에 대한 계약이지 pg사에서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E-wallet은 개인 정보를 보관한다.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그 정보를 결제에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한국에서의 시작이 쉽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
한국의 핀테크
많은 나라에서 핀테크 사업 모델이 나올 당시 한국에서도 핀테크 비즈니스를 시도한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금융 감독원과 관계자들은 공인 인증서를 거치지않는 거래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 중, 공인 인증서 없이 최초로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작한것이 바로 토스(Toss) 이다.
옛날의 전자 지갑은 현재 베트남의 momo페이, zalo페이 처럼 돈을 충전해놓고 쓰는식이었으나, 더 발전된 카카오 페이, 라인 페이의 경우에는 미리 계좌,카드를 연동해두고 실제로 e-wallet에 돈이 없더라도 자동 충전 후 사용할수있게끔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건 자동 충전이라곤해도 무조건 돈은 e-wallet에 들어왔다가 나간다는점)
사실 대부분의 E-wallet (페이팔, 알리페이 등)이 정말 기본적인 개념의 전자지갑부터 시작했다. (버스카드 처럼 충전해놓고 쓰는식)
요즘처럼 e-wallet도 계좌/카드를 연동해두고 그때 그때 자동충전&사용이 되므로 넒은 의미의 PG, 즉 말그대로 payment 게이트 웨이에 속한다고 볼수있다.
이 글을 갑자기 적게 된건, 이번에 대만지사 pm님과 대만 현지 PG 연동 관련 미팅을 진행하다가 pm님이 라인페이를 PG라 칭하셨기 때문이다..😶
그레이한테 이 pg의 역사에 대해 듣다보니 넓은 의미의 PG에는 전자지갑류가 당연히 속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한국만 이니시스, kcp 등을 PG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전자지갑이라 구분하여 칭하는 것이지 다른나라에서는 그냥 PG라 칭한다고 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iu0907&logNo=221398410452
- https://umbum.dev/990